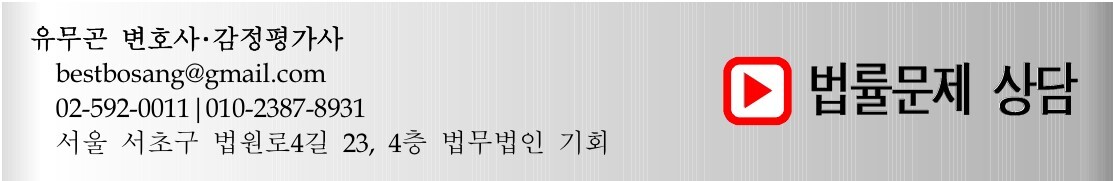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본문
1. 규범적 부분의 의의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란 임읨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퇴직・해고・전직・전적 등 인사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작업환경・작업용품부담 등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징계 등 제재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임금・근로시간・인사・복지 기타 대우 등 이른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규범적 효력
-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그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미치게 된다(대법원 94다49847 판결).
3. 규범적 효력의 내용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인정되고(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이나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보충적・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 규범적 효력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수권설 : 단체협약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성립되는 단체계약 또는 일종의 무명계약일 뿐이고 이러한 계약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을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법률규정으로 본다.
- 집단적 규범계약설 :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일종의 채권계약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등 사이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개개 근로자가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인 규율에 맡긴 이상 그에 기초하여 개별약정에 우선하는 집단적인 규범으로서 강행성・보충성을 갖게 되는 집단적인 규범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4.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면 개별 조합원이 직접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행을 구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조합원 이외에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막론하고 이를 준수할 협약준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정당사유의 경합 (0) | 2023.04.12 |
|---|---|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0) | 2023.04.12 |
| 단체협의의 내용 구분 (0) | 2023.04.12 |
| 노동조합 중복가입 (0) | 2023.04.12 |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0) | 2023.04.12 |